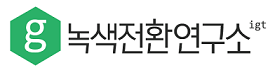농촌 마을에서 자랐지만 농사는 잘 알지 못했다. 농번기에 간간이 일손을 보탰을 뿐 농업과 농촌, 농민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기억은 별로 없다.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짓겠다는 아이들도 그걸 기대하는 어른들도 거의 없었다. 이후에 도시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동안 다시 농업과 농촌, 농민들을 만났다. 연례 행사처럼 농촌에 일손 돕기를 가거나 도농교류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아는 농촌’이 생겨나고, 철따라 달라지는 논밭 풍경과 때에 맞는 일거리가 조금씩 눈에 익어갔다.
그러면서 다행히 겨우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농 감수성’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계절과 무관하게 반복되는 도시의 삶을 사는 ‘농알못 (농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가깝지만, 작물을 심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거두는 농사의 계절과 주기를 어렴풋이나마 알아갈수록 덩달아 몸이 원하는 제철의 맛을 알아차리게 된다. 요즈음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슈퍼마켓의 진열대보다 그 제철의 감각에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난다.
하지만 많은 도시민의 일상에서 ‘농’ 과의 접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언론에서 다루는 농업 관련 기사란 대체로 ‘폭등’하거나 ‘폭락’했다는 물가 이야기 정도다. 매일같이 먹을거리를 마주하면서도 포장되거나 조리된 음식 너머로 시선이 가닿기는 어렵다.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먹방과 맛집 정보로 수렴되는 사이 ‘농알못’ 은 계속 늘어간다. 한편으로는 경지 면적이 줄고 농촌 마을과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돌아갈’ 농촌은커녕 ‘찾아갈’ 농촌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농촌 고령화도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어섰다는 통계에서 새삼 현실을 실감한다.
농업을 알지 못해도 딱히 불편하거나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언론과 정치 등 공론장과 의사 결정의 단위에서 ‘농’ 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데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농업과 먹을거리는 떼어내 생각할 수 없고, 그렇기에 농의 문제는 4.5%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밥을 먹는 국민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가을이다.
농성장의 목소리
지난 9월, 급기야 농민들이 청와대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단식을 시작했다. 농업 현실은 늘 어렵다지만 농민들이 모인 자리에선 늘상 음식과 곡주를 나누던 모습이 익숙했던 터라 농성장의 풍경이 조금 생경하게 느껴졌다. 농민들이 먹거리를 끊음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구호는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농정 대개혁’ 이다. 곧 농업이 국가 공동체의 근간임을 확인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먹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정권 교체 이후 농업 정책의 변화, 나아가 농정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를 기대했던 마음이 1년 반 사이에 답답함과 분노로 바뀌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전임 정권과 비슷한 언사로 농심을 달랬던 대통령과 새 정부는 이후에도 전임 정권과 비슷하게 농업을 외면했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에서 농업과 관련된 언급은 들을 수 없었다. 해당 부처의 장관과 담당 비서관의 공석이 3개월 여 동안 방치되었을 만큼 농정의 공백과 소통 창구의 부재도 계속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는 올해(2018년)를 원년으로 하여 “농정 개혁을 넘어 농업 대변화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재로선 이행되지 않는 공약과 다름이 없다. “우리 삶 속에서 농업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생산물’이 아닌 ‘사람’ 중심의 농정” 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고, “‘농업 생산성 제고’에서 ‘지속 가능성’ 과 ‘혁신’에 중점” 을 둔다는 농정 방향은 그 자체로는 지금 농성장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다.
하지만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GMO 완전 표시제와 학교 급식에서의 우선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음에도 기존 입장에서 그다지 진전이 없었던 정부의 답변은 변화를 기대했던 농민,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그런가 하면 농업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 ‘스마트팜 밸리’ 를 혁신 농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면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열어줄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농민의 삶과 국민 건강을 위한 농정,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농정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성이 계속되면서 여론과 정치권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지만 실질적인 개혁의 약속과 실행을 기다리며 릴레이 단식은 계속 진행중이다. 바로 지금이 아니라면 더는 변화와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에 절절함이 가득하다. 각지의 시민들이 농성장을 찾아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건네고 있다. 다른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변화는 관료와 정치가들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결국 시민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더 많은 이들에게 농성장의 목소리가 전해지길 바라는 이유다.
농의 가치를 아는 시민들
농업을 둘러싼 절망적인 환경 속에 반길 만한 소식도 전해진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내년(2019년) 부터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연 60만원의 농민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몇몇 지자체에서 도입을 검토하거나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아직은 작은 규모의 시작 단계이지만 나아가 전국 단위에서 명실상부 ‘농민 기본소득’ 에 걸맞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기대를 갖게 한다. 이 역시 농정의 개혁, 농정 방향의 전환을 전제로 가능한 일이다.
이 농민 기본 소득 논의에서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즉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자연 경관과 생태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의 기능이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올해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도 명시되었다. 개헌안은 무산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 나간다면 그 자체로 농업 정책의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보다 ‘농’ 의 가치를 아는 시민들의 인정과 지지가 아닐까. 농을 안다는 것은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 그래서 밥과 농 사이 희미해져버린 연결고 리를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농업을 나와 우리의 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그 힘으로 농업의 진짜 변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